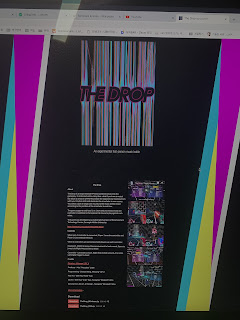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내가 졸업한 카네기멜론 대학교의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이하 ETC) 에서는 학생들이 매 학기 회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다니는 회사 2K Sports가 난데없이 올해 봄학기 우리 학교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
우리학교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는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던 우리 보스는 ETC 출신인 내게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을 맡겼고, 나는 생각나는 대로 프로젝트 기획을 써 내려갔다. "로켓 리그가 축구를 재발명한 것처럼 농구를 재발명하라!" 농구게임 회사인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새로운 게임 프로토타이핑을 좋아하는 내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기획이었다. 보스는 별다른 수정 없이 이 기획안을 학교에 그대로 제출했다.
내 기획안이 통과된 덕에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목요일에 피츠버그로 날아가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미팅을 하고 왔다.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오다니, 기분 정말 이상했다.
미팅중에 프로젝트 담당 교수님 중 한 분이 내게 말했다. "우리 아직도 애들한테 네 게임 Beatstep Cowboys를 참고자료로 보여주고 있어." "정말요?" 나중에 물어보니 지금 1학년인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게임을 알고 있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낯뜨거워졌다. 올해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발매해야겠다 라고 속으로 백번쯤 넘게 생각했다.
그런데 대화 중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다른 한 교수님이 내게 말했다. "나는 네 프로젝트 중에 The Drop 진짜 좋아한다." The Drop: The Game은 오버워치같은 1인칭 슈팅 게임에 EZ2DJ같은 리듬게임을 합쳐보겠다는 나의 정신나간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였다. 2학기때 친구들을 모아 팀을 이뤄 교수님들께 아이디어를 심사받고 통과하여 학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해!). 하지만 워낙에 하드코어한 장르의 게임 둘을 합치다 보니 교수님 중에선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몇 없었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 기능을 만드려던 다음학기 계획도 무산되었다.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속에서도 점점 잊혀졌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 해괴한 프로젝트를 나보다 더 잘 기억하고 학생들에게 더 잘 설명하는게 아닌가! "이 게임에선 총을 쏘려면 리듬에 맞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크로스페이더를 점령하면 두 음악이 거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믹스되고.."
맞아, 우리가 저런 걸 했었지.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게임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새로운 아이디어.
집에 돌아와 2015년에 만들어둔 The Drop의 빌드를 찾아 실행했다. 옆 방에 사는 트랩 DJ겸 프로듀서이자 하드코어 게이머인 룸메이트 토마스(DJ네임 T-Mass)에게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했다. 이 집에 이사왔을 땐 재미있어할지 자신이 없어 묻질 못했었다. 음악과 게임을 모두 좋아하는 토마스는 처음 해보는 게임에서 날 처참히 발라버렸을 정도로 게임을 바로 숙지했다. 정말 재밌다며, 돈 받고 팔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래, 어렵지만 우리처럼 이 게임을 좋아할 변태같은 사람이 분명 더 있을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이후 몇 년이 지난 이제야 이 게임을 무료로 공개하려고 한다. 몇 년만에 다시 해보니 고치고 싶은 점도 보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밤새 머리를 싸매며 했던 재미있는 생각들이 게임에 녹아있는 걸 보고 감탄했고, 어찌됐던 당장 공개해야겠다고 느꼈다. 누군가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받은 느낌을 가지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하면 충분하다. 지금 아니면 또 언제가 될 지 모르니까. 정식 공개는 내일 예정.
What a strange coincidence.
So I've been working for 2K Sports since I graduated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s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3 years ago, and now my company 2K Sports is sponsoring a 'client project' for my school this spring.
As an ETC alum, I got to write the project description with my personal taste in favor of prototyping new games - "Reinvent basketball like Rocket League reinvented soccer!"
I came back from South Korea last Monday and flew to Pittsburgh Thursday to meet the faculty advisors and the students. It did feel quite strange to visit my school as a client.
One of the faculty advisors told me that they still show Beatstep Cowboys to the students in the classes. It was both awesome and burdening to hear that. Listening to that I told myself 100 times that I'll finish the game this year no matter what.
The other faculty advisor told me, "I really liked The Drop among your projects". The Drop is a game started from a crazy idea of combining an FPS with a rhythm game. It was so hardcore that most of the faculty members couldn't even play it. The grade wasn't good either.
But this one remembered the game and explained it to the students much better than me. "You have to match the rhythm to shoot in this game, and also you fight over the control of the crossfader to mix your music over the opponent's music".
Then my memory rushes in, ah yes, we indeed have done something like that. Our goal was to suggest a new idea of video gaming. That this kind of game could exist.
I came back from Pittsburgh and found a build of The Drop we made in 2015. I asked my housemate who happens to be a DJ, Producer, and a hardcore gamer to play it against me. He didn't only beat me to death in his very first trial but also said he really liked the game. I’m convinced that there must be someone like Thomas and me who’d like to play this kind of game.
So I'm launching the game for free, as we always planned. There are things that can be obviously improved, but for all the interesting ideas and efforts we put into the game, I felt like I shouldn't delay any moment. It's enough if someone plays our game and gets inspired.
The official release post and a post-mortem will follow tomorrow.